기욤 뮈소의 <안젤리크>를 읽었다. 신간을 읽은 게 얼마만인지.
- 저자
- 기욤 뮈소
- 출판
- 밝은세상
- 출판일
- 2022.12.21
안젤리크 인물 관계도
나름 열심히 정리해 봤다. <안젤리크>의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고, 다음과 같이 엮여있다. 어떤 관계로 엮여 있는지는 일부러 적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관계를 표시하다간 까딱 잘못하면 스포를 해버릴 것 같아서. 그리고 이야기의 중요한 복선이나 반전 요소가 되는 부분도 표시하지 않았다.

책의 제목은 <안젤리크>이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루이즈와 마티아스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주요 사건은 루이즈의 엄마인 스텔라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루이즈는 은퇴한 형사인 마티아스에게 막무가내로 엄마의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들이대고, 결국 마티아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다. 추리해가는 과정에서 인물들의 사연이 얽히고, 과거의 사건과 비밀들이 드러나며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안젤리크>를 먼저 읽은 건 큰 조카님이다. 책 소개글을 보고 재미있어 보여서 읽었다고 한다. 먼저 읽고는 나에게 말하길, 재미있는데 뒷부분의 개연성이 조금 약하고, 마티아스의 과거 이야기는 좀 쓸데없어 보여요 라고 했다.
나는 기욤 뮈소의 소설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약간의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다. 거기에 조카님의 감상을 더해 약간의 의구심까지 가지고.
다 읽고 난 나의 감상은, 조카님의 감상에 일부 동의한다 이다.
루이즈의 의뢰에 대한 답은 소설 중반부에 일찌감치 밝혀진다. 이쯤에서부터 이 책은 추리보다는 각 인물들간의 얽히고설킨 관계를 짚어가기 시작한다.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초반부가 흥미진진했다면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는 묘한 막장 드라마의 향기가 풍긴다. 아주 비약하자면, 이 책에서 가장 마지막에 밝혀지는 사실은 결국 출생의 비밀인 셈이었다.
이 책은 팬데믹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현대 사회 문제나 이슈들이 다양하게 섞여 풍부한 배경을 만들어낸다. 주요 인물의 코비드 감염으로 인한 사망,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조력자, '인셀'이 일으키는 비극적 범죄, 교권의 추락, 인물의 서사를 보충해주는 젠더 이슈 등이 그것이다. 거기에 개인의 욕망을 표출하는 인물들이 더해져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인간상들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언뜻 조화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 근 2~3년 이내에 대두된 사회 문제나 사회 현상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담아낸 것이 굉장히 놀라웠다. 그 가운데 마티아스의 과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조카님은 이것이 다소 생뚱맞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이 역시 설득력있는 인물의 과거사이자 인물 설정이라고 생각했다.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해냈지만, 오히려 과잉 대처로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마티아스가 느끼는 괴로움과 분노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의 반대에서 마냥 그를 비난하기 바쁜 이들에게 나 역시 화가 났고.
후반부가 약간 시시하다는 점,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를 끼워 맞추다보니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점을 빼면 나름 재미있고 쉽게 잘 읽히는 소설이었다. 그리고 감히(겨우 하나 읽고) 추측하건대, 기욤 뮈소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글을 잘 쓰는 작가인 것 같았다.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를 써내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막힘없이 써내려가는 스타일인 것 같다. 쓸데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보다는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간결한 묘사를 택하고, 좁고 깊은 이야기보다는 넓고 얕은 이야기를 펼쳐내는 편이 아닐까. 처음으로 접한 소설이 나쁘지 않아서 언제든 가볍고 재미있게 읽고 싶은 게 생기면 그의 소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와중에 발견한 오류
잊어버리다 / 잃어버리다

" 첼로를 차 안에 놓아두고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상태로 내렸던데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
맥락 상 '잊어버리면'이 아니라 '잃어버리면'이 맞는 거 같다.
일부러는 아닌데 우연히 이런 오류를 발견하면 그 순간부터 약간 주객이 전도된다.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오류를 찾고싶어진다. 물론 내용을 적당히 잘 따라가면서.
역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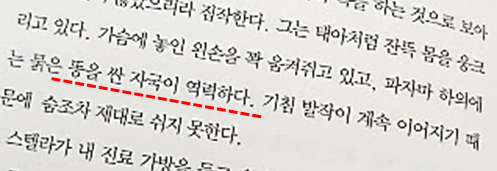
이건 오류라기 보다는 조금 어색하게 읽혀서 사전을 찾아봤다.
역력하다
표준국어대사전: 자취나 기미, 기억 따위가 환히 알 수 있게 또렷하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 : (자취나 낌새가 어디에) 훤히 알 수 있게 분명하고 또렷하다.
뜻으로만 보면 쓰임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역력하다'가 쓰이는 경우는 물리적인 흔적이나 눈에 분명히 띄는 자국보다는 기분이나 분위기, 감정 등을 표현할 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사전의 예문을 찾아보면 그 차이가 좀 더 와닿는다.
나를 경계하는 것도 같고 두려워하는 것도 같은 그런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다.
출처 <<이청준, 조율사>>
말끝을 흐리는 엄마의 얼굴에 역력한 공포가 떠올랐다.
출처 <<박완서, 도시의 흉년>>
사람들의 표정에는 우울하면서도 의기소침한 빛이 역력했고, 시끌벅적하던 아우성 소리도 언제 그랬나 싶게 땅속으로 꺼져 버렸다.
출처 <<막심 고리키, 어머니>>
원균은 갑자기 안색이 굳으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출처 <<고정욱, 원균 그리고 원균>>
이런 쓰임으로 주로 보다보니 '자국이 역력하다'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진 것 같다. '흔적이 역력했다'는 식으로 쓰인 예문도 있으니 틀린 표현은 아니긴 하다.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거슬리는거지.
다양한 폰트의 사용이 주는 눈의 피로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안젤리크>에는 일반적인 소설의 흐름 외에 기사글이나 인터뷰 상황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폰트가 각각 다르다.

기사는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 짧은 분량이라 다소 부담스러운(?) 크기의 폰트여도 크게 무리가 되진 않았다. 그런데 마티아스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마티아스의 인터뷰 상황을 글로 옮긴 부분은 가독성이 그리 좋지 않은 타자기 형태의 폰트가 꽤 길게 이어졌다. 어떤 분위기를 주려고 했는지는 알겠는데, 눈에 피로를 주는 형태라 좀 많이 불편했다. 강조를 위해 짧은 문단에 사용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건 좀 눈이 아픈 것 같다.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뭐. 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책 얘기보다 사족이 더 길었던 <안젤리크> 감상문이었습니다. 끗.
'읽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0207 | 뜻대로 하세요 As you like it / 셰익스피어 (0) | 2023.02.15 |
|---|---|
| 20230211 | 공산당 선언 리부트; 지젝과 다시 읽는 마르크스 / 슬라보예 지젝 (0) | 2023.02.14 |
| 20221228 |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 / 로셀라 포스토리노 (0) | 2022.12.28 |
| 20221129 | 그림자를 판 사나이 /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 (0) | 2022.11.29 |
| 20221012 | 캐리 Carrie / 스티븐 킹 (0) | 2022.10.13 |